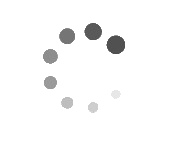조선고적조사보고 : 대보면제7호분 (도면)
이미지
- 제공기관
-
- · 촬영연도 : 1937
- · 촬영기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 소장기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공공누리 유형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정보
- 저작물 설명
-
제5호분의 서쪽에 흘립(屹立)하고 있는 큰 고분이다. 분구의 높이는 남쪽 가장 낮은 곳에서 재면 25척에 이르지만 북쪽은 지반이 높기 때문에 10척 정도 준다. 대략 방대형을 이루고 있고 그 직경은 동서? 90척, 남북쪽 110척 남짓이다. 현재의 분정(墳頂)은 멀리 떨어진 북쪽에 치우쳐 있다. 봉토는 여기저기 깎여 남쪽 또한 오목한 형태(凹形)로 함몰되었다. 도굴의 흔적이 역력한데 벽화의 잔존에 만일의 기대를 가지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 봉토 안에 나란히 있는 동서쪽 1쌍의 곽실을 주체로 하는 구조인 것을 알았을 뿐 벽화는 없고 유물 또한 2개의 쇠못을 발견했을 뿐 얻을 것이 없었다. 그 회반죽 없이 쌓아올려 연도 입구를 막고 있는 돌 속에서 단란(斷爛)한 『평양매일신문(平壤每日新聞)』의 작은 종이 조각을 얻었는데 그 기사 중에 「미쓰야(三矢) 경무국장(警務局長) 국경의 방비」「구참(口參)년 10월 20일」등의 문자가 있다. 10년 전에 평양에서 와서 발굴한 자가 있었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에 맞추어 총독부 치하에 도굴이 행해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은 사적 보존의 견지에서 유감을 느낀다. 고분의 주체인 동실(東室)과 서실(西室)은 연도 입구의 미석(楣石) 중앙에서 14척 3촌 떨어진 곳에 있고 양자가 서로 늘어서 있다. 그 상면(床面)은 양쪽 다 분정(墳頂)에서 17척 6촌 아래쪽에 있다. 마침 분구의 서쪽 기슭 중앙부에 있는 밭의 면상(面上)과 일치한다. 둘 다 정남쪽에서 약 20° 서쪽에 치우쳐 입을 열고 있고 본래 계획적으로 하나의 고분의 주체로서 만들어진 것을 나타낸다. 동쪽 곽실, 현실의 크기는 북쪽 벽 6척 3촌 5분, 동쪽 벽 8척 3촌의 구형(矩形)이다.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약 8척 3촌이고 그 중 네 벽은 높이 5척 1촌 정도로 위쪽이 앞으로 쓰러져 있다. 위에 1단(段)의 선반받침과 2중의 삼각형 선반받침을 구석구석에서 대고 가장 위에 사각형 천장을 얹은 구조는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곳이 없다. 실내의 회반죽은 흙이 녹슬어 있기 때문에 오손이 많다. 돌을 쌓은 법과 회반죽을 바른 법 둘 다 조잡하고 울퉁불퉁하여 융와(隆?)가 심하다. 한군데도 승묵(繩墨)에 해당하는 곳은 없다. 바닥은 할률(割栗) 위에 1촌 5분 두께의 목탄층을 놓고 표면 1촌 두께로 회반죽을 바른 것인데 이 또한 높고 낮음이 많고 게다가 지금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바닥 위에는 동서쪽의 벽을 따라 각 1개의 관대(棺臺)를 놓았다. 대석(臺石)은 거친 면의 화강암석으로 서쪽은 길이 6척 8촌 5분, 폭 2척 6촌이다. 동쪽의 길이는 좀 길지만 폭은 2촌으로 좁다. 두께는 둘 다 부정(不定)하고 3촌 5분 내지 1촌 5분 사이에 있다. 각각 푸른 돌의 각형(角形) 다리 4개로 지탱한다. 입구는 남쪽 벽 중앙에서 약간 서쪽에 편재하고 폭은 3척 3촌 8분, 높이 5척 5촌의 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연도로 통한다. 이 연도는 길이 12척 7촌으로 그 폭은 입구와 동일하고 넓이는 좁지 않다.
저작물 설명제5호분의 서쪽에 흘립(屹立)하고 있는 큰 고분이다. 분구의 높이는 남쪽 가장 낮은 곳에서 재면 25척에 이르지만 북쪽은 지반이 높기 때문에 10척 정도 준다. 대략 방대형을 이루고 있고 그 직경은 동서? 90척, 남북쪽 110척 남짓이다. 현재의 분정(墳頂)은 멀리 떨어진 북쪽에 치우쳐 있다. 봉토는 여기저기 깎여 남쪽 또한 오목한 형태(凹形)로 함몰되었다. 도굴의 흔적이 역력한데 벽화의 잔존에 만일의 기대를 가지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 봉토 안에 나란히 있는 동서쪽 1쌍의 곽실을 주체로 하는 구조인 것을 알았을 뿐 벽화는 없고 유물 또한 2개의 쇠못을 발견했을 뿐 얻을 것이 없었다. 그 회반죽 없이 쌓아올려 연도 입구를 막고 있는 돌 속에서 단란(斷爛)한 『평양매일신문(平壤每日新聞)』의 작은 종이 조각을 얻었는데 그 기사 중에 「미쓰야(三矢) 경무국장(警務局長) 국경의 방비」「구참(口參)년 10월 20일」등의 문자가 있다. 10년 전에 평양에서 와서 발굴한 자가 있었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에 맞추어 총독부 치하에 도굴이 행해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은 사적 보존의 견지에서 유감을 느낀다. 고분의 주체인 동실(東室)과 서실(西室)은 연도 입구의 미석(楣石) 중앙에서 14척 3촌 떨어진 곳에 있고 양자가 서로 늘어서 있다. 그 상면(床面)은 양쪽 다 분정(墳頂)에서 17척 6촌 아래쪽에 있다. 마침 분구의 서쪽 기슭 중앙부에 있는 밭의 면상(面上)과 일치한다. 둘 다 정남쪽에서 약 20° 서쪽에 치우쳐 입을 열고 있고 본래 계획적으로 하나의 고분의 주체로서 만들어진 것을 나타낸다. 동쪽 곽실, 현실의 크기는 북쪽 벽 6척 3촌 5분, 동쪽 벽 8척 3촌의 구형(矩形)이다.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약 8척 3촌이고 그 중 네 벽은 높이 5척 1촌 정도로 위쪽이 앞으로 쓰러져 있다. 위에 1단(段)의 선반받침과 2중의 삼각형 선반받침을 구석구석에서 대고 가장 위에 사각형 천장을 얹은 구조는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곳이 없다. 실내의 회반죽은 흙이 녹슬어 있기 때문에 오손이 많다. 돌을 쌓은 법과 회반죽을 바른 법 둘 다 조잡하고 울퉁불퉁하여 융와(隆?)가 심하다. 한군데도 승묵(繩墨)에 해당하는 곳은 없다. 바닥은 할률(割栗) 위에 1촌 5분 두께의 목탄층을 놓고 표면 1촌 두께로 회반죽을 바른 것인데 이 또한 높고 낮음이 많고 게다가 지금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바닥 위에는 동서쪽의 벽을 따라 각 1개의 관대(棺臺)를 놓았다. 대석(臺石)은 거친 면의 화강암석으로 서쪽은 길이 6척 8촌 5분, 폭 2척 6촌이다. 동쪽의 길이는 좀 길지만 폭은 2촌으로 좁다. 두께는 둘 다 부정(不定)하고 3촌 5분 내지 1촌 5분 사이에 있다. 각각 푸른 돌의 각형(角形) 다리 4개로 지탱한다. 입구는 남쪽 벽 중앙에서 약간 서쪽에 편재하고 폭은 3척 3촌 8분, 높이 5척 5촌의 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연도로 통한다. 이 연도는 길이 12척 7촌으로 그 폭은 입구와 동일하고 넓이는 좁지 않다.
- 다운로드
-
※ 고화질의 대용량(20~30MB/장)사진의 경우 다운로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예시
- 예시
01 -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 예시
02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 예시
03 -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알아야 할 사항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신청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
고품질 공공저작물 원본 신청
공공누리에서 제공하는 공공저작물 중 공공누리 1유형은 출처표시만 한다면 영리, 비영리 목적으로 모두 활용 가능하며 개작 등 2차 변형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저작물 제공과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원본 이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본 신청 파일 수령 안내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공공저작물 원본 파일을 방문수령 또는 저장장치 배송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본 신청 접수 완료 후 상세 수령 절차는 기입하신 이메일을 통해 안내 드립니다.
* 1일 이내 안내메일 발송(주말제외)
* 원본 저장 장치(USB, 외장하드 등)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하며 왕복 택배비는 신청자 부담입니다.
개인정보이용 동의 안내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공공저작물 원본 관리 및 전달 등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기 업 : 기업명, 소속/부서
- 담 당 자 : 성명, 이메일 주소
- 일반 국민 : 성명,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수집목적
- 이용허가 및 저작권 이용관리
보유기간 : 수집된 정보는 3년간 보존하며, 수집된 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저작권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본신청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
공공누리 이용 약관 및 개인 정보이용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