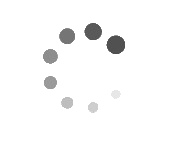조선고적조사보고 : 대동강면제2호분구조 (이미지)
이미지
- 제공기관
-
- · 촬영연도 : 1926
- · 촬영기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 소장기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공공누리 유형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정보
- 저작물 설명
-
구릉 위를 파내면 8, 9척의 광저(壙底)에 먼저 점토를 깔고, 7·8촌의 율재(栗材) 3개를 중앙과 양쪽 끝에 가로로 놓아 마룻귀틀로 하고, 그 위에 같은 크기의 율재를 나란히 놓아 바닥을 만들었다. 사방의 벽은 같은 율재를 마치 교창(校倉) 만들기와 같이 쌓아 올려 축조하고, 어느 높이에 이르러 이 벽 위에 율재를 다시 옆으로 나열해 천장의 구조를 이루고 네 벽의 외면은 반 장 두께이다. 문양을 가지고 있는 2가지 종류의 전돌(塼)로 막고 다시금 그 밖을 두껍게 점토로 둘러 빗물 침투를 막은 뒤 비로소 봉토를 쌓아 방대상(方臺狀)의 외형을 이룬 것이다. 나중에 설명할 제6호분에는 천장 위에도 한 장 가량의 복전(覆塼)이 있었다. 이 고분도 아마 그러했을 것이다. 단 이 고분은 후세에 발굴, 봉토, 혼란의 흔적이 있고 천장에 복전과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도굴 때 옮겨진 것인지 모르지만 이는 불분명하다. 목곽(木槨)을 구성하는 목재를 임학박사인 가와이 시타로(河合?太郞) 씨에게 감정을 청해 그에게서 ‘목재는 조선산 율재(栗材)이다. 역시 조직이 완전하고 충분히 강하다. 율재는 흙 속에서 내구력이 매우 커서 고분의 상재(床材)로서 매우 적당한 것이다’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상상했듯이 과연 율재였다. 이에 의해 다른 제3호분, 제6호분의 곽재(槨材)도 마찬가지로 율재인 것이 확실해졌다. 목곽의 외면에는 이미 기술한 오야리(梧野里) 고분이나 다음에 설명할 제3호분과 같이 바로 점토를 접착하지 않고 그 사이를 반장(半枚) 두께의 전돌(塼)을 두른 것은 그것들에 비해 한발 앞선 형식이다. 축조 초기에는 봉토를 침투하는 빗물은 점토층 때문에 차단되어 곽 안에 들어가기 힘들지만 목곽(木槨)은 차차 썩어 결국에는 봉토의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봉토와 함께 곽(槨) 안에 추락하기에 이르렀다. 또 네 벽의 곽재(槨材)도 썩어 그 밖에 있는 전토(塼土)가 내부에 솟아올랐다. 천장을 덮었던 점토도 네 벽 밖을 둘렀고 전돌도 봉토도 한데 섞여 아주 혼란했다. 이 때문에 위에서 침투해오는 빗물이 사정없이 곽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이르고, 바닥 아래의 점토에 차단되어 이에 고이게 되었다. 일찍이 벽이나 천장을 구성했던 곽(槨), 재(材)는 긴 세월 동안 썩어 진흙 속에 완전히 형적(形迹)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다행이 바닥 부근은 항상 빗물이 내려 고였기 때문에 목곽 하부, 목벽 하부, 특히 바닥을 구성하는 목재는 거의 무사히 그 형태를 남기고 있고 나중에 설명할 제6호분의 발굴상태와 함께 축조 당시의 형식을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목곽은 거의 남쪽에 면하고 봉토의 방대형의 우각이 사방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은 흥미 있는 사실이다. 그 크기는 동서쪽 약 11척 2촌, 남북쪽 약 11척 6촌 5분인데 높이는 전혀 불분명하다. 상재는 동서쪽 방향에 가로로 늘어 놓았는데 모두 16개가 있었다. 지금은 양쪽 모두 썩고 메말라 있지만 당초 약 7촌의 폭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또 두께는 지금 7, 8촌 정도이다.
저작물 설명구릉 위를 파내면 8, 9척의 광저(壙底)에 먼저 점토를 깔고, 7·8촌의 율재(栗材) 3개를 중앙과 양쪽 끝에 가로로 놓아 마룻귀틀로 하고, 그 위에 같은 크기의 율재를 나란히 놓아 바닥을 만들었다. 사방의 벽은 같은 율재를 마치 교창(校倉) 만들기와 같이 쌓아 올려 축조하고, 어느 높이에 이르러 이 벽 위에 율재를 다시 옆으로 나열해 천장의 구조를 이루고 네 벽의 외면은 반 장 두께이다. 문양을 가지고 있는 2가지 종류의 전돌(塼)로 막고 다시금 그 밖을 두껍게 점토로 둘러 빗물 침투를 막은 뒤 비로소 봉토를 쌓아 방대상(方臺狀)의 외형을 이룬 것이다. 나중에 설명할 제6호분에는 천장 위에도 한 장 가량의 복전(覆塼)이 있었다. 이 고분도 아마 그러했을 것이다. 단 이 고분은 후세에 발굴, 봉토, 혼란의 흔적이 있고 천장에 복전과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도굴 때 옮겨진 것인지 모르지만 이는 불분명하다. 목곽(木槨)을 구성하는 목재를 임학박사인 가와이 시타로(河合?太郞) 씨에게 감정을 청해 그에게서 ‘목재는 조선산 율재(栗材)이다. 역시 조직이 완전하고 충분히 강하다. 율재는 흙 속에서 내구력이 매우 커서 고분의 상재(床材)로서 매우 적당한 것이다’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상상했듯이 과연 율재였다. 이에 의해 다른 제3호분, 제6호분의 곽재(槨材)도 마찬가지로 율재인 것이 확실해졌다. 목곽의 외면에는 이미 기술한 오야리(梧野里) 고분이나 다음에 설명할 제3호분과 같이 바로 점토를 접착하지 않고 그 사이를 반장(半枚) 두께의 전돌(塼)을 두른 것은 그것들에 비해 한발 앞선 형식이다. 축조 초기에는 봉토를 침투하는 빗물은 점토층 때문에 차단되어 곽 안에 들어가기 힘들지만 목곽(木槨)은 차차 썩어 결국에는 봉토의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봉토와 함께 곽(槨) 안에 추락하기에 이르렀다. 또 네 벽의 곽재(槨材)도 썩어 그 밖에 있는 전토(塼土)가 내부에 솟아올랐다. 천장을 덮었던 점토도 네 벽 밖을 둘렀고 전돌도 봉토도 한데 섞여 아주 혼란했다. 이 때문에 위에서 침투해오는 빗물이 사정없이 곽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이르고, 바닥 아래의 점토에 차단되어 이에 고이게 되었다. 일찍이 벽이나 천장을 구성했던 곽(槨), 재(材)는 긴 세월 동안 썩어 진흙 속에 완전히 형적(形迹)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다행이 바닥 부근은 항상 빗물이 내려 고였기 때문에 목곽 하부, 목벽 하부, 특히 바닥을 구성하는 목재는 거의 무사히 그 형태를 남기고 있고 나중에 설명할 제6호분의 발굴상태와 함께 축조 당시의 형식을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목곽은 거의 남쪽에 면하고 봉토의 방대형의 우각이 사방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은 흥미 있는 사실이다. 그 크기는 동서쪽 약 11척 2촌, 남북쪽 약 11척 6촌 5분인데 높이는 전혀 불분명하다. 상재는 동서쪽 방향에 가로로 늘어 놓았는데 모두 16개가 있었다. 지금은 양쪽 모두 썩고 메말라 있지만 당초 약 7촌의 폭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또 두께는 지금 7, 8촌 정도이다.
- 다운로드
-
※ 고화질의 대용량(20~30MB/장)사진의 경우 다운로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예시
- 예시
01 -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 예시
02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 예시
03 -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알아야 할 사항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신청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
고품질 공공저작물 원본 신청
공공누리에서 제공하는 공공저작물 중 공공누리 1유형은 출처표시만 한다면 영리, 비영리 목적으로 모두 활용 가능하며 개작 등 2차 변형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저작물 제공과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원본 이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본 신청 파일 수령 안내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공공저작물 원본 파일을 방문수령 또는 저장장치 배송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본 신청 접수 완료 후 상세 수령 절차는 기입하신 이메일을 통해 안내 드립니다.
* 1일 이내 안내메일 발송(주말제외)
* 원본 저장 장치(USB, 외장하드 등)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하며 왕복 택배비는 신청자 부담입니다.
개인정보이용 동의 안내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공공저작물 원본 관리 및 전달 등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기 업 : 기업명, 소속/부서
- 담 당 자 : 성명, 이메일 주소
- 일반 국민 : 성명,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수집목적
- 이용허가 및 저작권 이용관리
보유기간 : 수집된 정보는 3년간 보존하며, 수집된 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저작권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본신청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
공공누리 이용 약관 및 개인 정보이용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