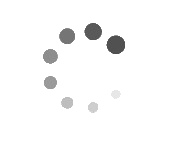조선고적조사보고 : 대동강면제9호분출토유물 (이미지)
이미지
- 제공기관
-
- · 촬영연도 : 1926
- · 촬영기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 소장기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공공누리 유형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정보
- 저작물 설명
-
죽은 사람의 머리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옥제(玉製)의 함(?), 충이(充耳), 비색(鼻塞), 안옥(眼玉)이 나왔고, 또 복부(腹部) 주변에서 옥제의 색간(塞杆)으로 여겨지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실로 흥미 있는 발견으로 한나라 시대의 장제(葬制)를 나타내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것들은 그 출토 위치에 따라 두부(頭部) 주변에서 발견된 선형(蟬形)의 옥(玉)은 입에 넣는 것이고 팔각형의 소간(小杆) 2쌍은 콧구멍 및 귓구멍을 막는 것, 또 2개의 얇은 행인양옥(杏仁樣玉)은 두 눈을 덮기 위해 이용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복부 주변에서 나온 팔각형의 약간 긴 옥간(玉杆)은 아마 항문을 막기 위해 사용된 것일 것이다. 그 입에 들어가는 것은 함(?)이고, 귓구멍을 막는 것은 충이(充耳) 또는 진(?)이라는 것은 명백한데 눈을 덮고 코를 막고 항문을 막는 것은 문헌상으로는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 게다가 서경잡기(西京雜記)에는 광천왕(廣川王) 거질(去疾)이 진(晋)나라 영공(靈公)의 무덤을 밝혔을 때의 일을 기록하여 「시유부괴(屍猶不壞) 공규중개유김옥(孔竅中皆有金玉)」이라고 실려 있는 것을 보면 일찍부터 죽은 사람의 공규(孔竅)를 금옥으로 막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관 속 죽은 사람의 가슴 부근에서 벽(璧)이 발견되었다. 고금도서집성체의전상장부휘고(古今圖書集成體儀典喪葬部彙考)에 죽은 사람을 감(?)할 때 6개의 옥(玉)을 가(加)할 것을 기록하여 말하길 『以組穿聯六玉溝?之中. 以?尸. 圭在左. 璋在首. 琥在右. 璜在足. 璧在背. 琮在服. 蓋取象方明. 神之也. 疏璧琮者通於天地.???????????????? 疏璧琮通天地者. 置璧於背. 以其屍仰. 璧在下也. 置琮於復. 是琮在上也. 而不類者. 以背爲陽. 以腹爲陰. 故隨屍腹背而置之. 天地爲陰陽之主. 人之腹背象之. 故疏璧琮以通天地也.』이라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배와 가슴을 위로 하여 반듯이 누이고 그 등에 벽(璧)을 두고 그 배에 옥홀(琮)을 놓는 것인데 이 9호분의 경우에는 6개 옥 중 벽(璧)만 죽은 사람의 등에 놓여 있던 것 같다. 다음으로 복부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금루세공(金縷細工)의 가장 정려(精麗)한 순금대교(純金帶?)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몸의 좌측에서 검이 나왔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왼쪽에 검을 차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양쪽 겨드랑이 주변에서 은제(銀製) 반지가 각 2개씩 발견되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양쪽 팔뚝을 구부려 손을 위로 굽히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에서 옥제의 돈(豚)이 발견되었다. 이 옥돈(玉豚)은 어떤 물건인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정설(定說)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그것이 나온 곳 왼쪽 겨드랑이 반지 옆에 있었던 점에서 추측하여 유희석명상제(劉熙釋名喪制)를 풀이한 것 중에 「악(握). 이물저시수중(以物著尸手中). 사악지야(使握之也).」라고 하는 말에 알맞게 죽은 사람에게 이것을 움켜쥐게 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저작물 설명죽은 사람의 머리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옥제(玉製)의 함(?), 충이(充耳), 비색(鼻塞), 안옥(眼玉)이 나왔고, 또 복부(腹部) 주변에서 옥제의 색간(塞杆)으로 여겨지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실로 흥미 있는 발견으로 한나라 시대의 장제(葬制)를 나타내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것들은 그 출토 위치에 따라 두부(頭部) 주변에서 발견된 선형(蟬形)의 옥(玉)은 입에 넣는 것이고 팔각형의 소간(小杆) 2쌍은 콧구멍 및 귓구멍을 막는 것, 또 2개의 얇은 행인양옥(杏仁樣玉)은 두 눈을 덮기 위해 이용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복부 주변에서 나온 팔각형의 약간 긴 옥간(玉杆)은 아마 항문을 막기 위해 사용된 것일 것이다. 그 입에 들어가는 것은 함(?)이고, 귓구멍을 막는 것은 충이(充耳) 또는 진(?)이라는 것은 명백한데 눈을 덮고 코를 막고 항문을 막는 것은 문헌상으로는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 게다가 서경잡기(西京雜記)에는 광천왕(廣川王) 거질(去疾)이 진(晋)나라 영공(靈公)의 무덤을 밝혔을 때의 일을 기록하여 「시유부괴(屍猶不壞) 공규중개유김옥(孔竅中皆有金玉)」이라고 실려 있는 것을 보면 일찍부터 죽은 사람의 공규(孔竅)를 금옥으로 막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관 속 죽은 사람의 가슴 부근에서 벽(璧)이 발견되었다. 고금도서집성체의전상장부휘고(古今圖書集成體儀典喪葬部彙考)에 죽은 사람을 감(?)할 때 6개의 옥(玉)을 가(加)할 것을 기록하여 말하길 『以組穿聯六玉溝?之中. 以?尸. 圭在左. 璋在首. 琥在右. 璜在足. 璧在背. 琮在服. 蓋取象方明. 神之也. 疏璧琮者通於天地.???????????????? 疏璧琮通天地者. 置璧於背. 以其屍仰. 璧在下也. 置琮於復. 是琮在上也. 而不類者. 以背爲陽. 以腹爲陰. 故隨屍腹背而置之. 天地爲陰陽之主. 人之腹背象之. 故疏璧琮以通天地也.』이라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배와 가슴을 위로 하여 반듯이 누이고 그 등에 벽(璧)을 두고 그 배에 옥홀(琮)을 놓는 것인데 이 9호분의 경우에는 6개 옥 중 벽(璧)만 죽은 사람의 등에 놓여 있던 것 같다. 다음으로 복부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금루세공(金縷細工)의 가장 정려(精麗)한 순금대교(純金帶?)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몸의 좌측에서 검이 나왔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왼쪽에 검을 차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양쪽 겨드랑이 주변에서 은제(銀製) 반지가 각 2개씩 발견되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양쪽 팔뚝을 구부려 손을 위로 굽히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에서 옥제의 돈(豚)이 발견되었다. 이 옥돈(玉豚)은 어떤 물건인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정설(定說)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그것이 나온 곳 왼쪽 겨드랑이 반지 옆에 있었던 점에서 추측하여 유희석명상제(劉熙釋名喪制)를 풀이한 것 중에 「악(握). 이물저시수중(以物著尸手中). 사악지야(使握之也).」라고 하는 말에 알맞게 죽은 사람에게 이것을 움켜쥐게 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 다운로드
-
※ 고화질의 대용량(20~30MB/장)사진의 경우 다운로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예시
- 예시
01 -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 예시
02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 예시
03 -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알아야 할 사항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신청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
고품질 공공저작물 원본 신청
공공누리에서 제공하는 공공저작물 중 공공누리 1유형은 출처표시만 한다면 영리, 비영리 목적으로 모두 활용 가능하며 개작 등 2차 변형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저작물 제공과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원본 이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본 신청 파일 수령 안내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공공저작물 원본 파일을 방문수령 또는 저장장치 배송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본 신청 접수 완료 후 상세 수령 절차는 기입하신 이메일을 통해 안내 드립니다.
* 1일 이내 안내메일 발송(주말제외)
* 원본 저장 장치(USB, 외장하드 등)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하며 왕복 택배비는 신청자 부담입니다.
개인정보이용 동의 안내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공공저작물 원본 관리 및 전달 등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기 업 : 기업명, 소속/부서
- 담 당 자 : 성명, 이메일 주소
- 일반 국민 : 성명,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수집목적
- 이용허가 및 저작권 이용관리
보유기간 : 수집된 정보는 3년간 보존하며, 수집된 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저작권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본신청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
공공누리 이용 약관 및 개인 정보이용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