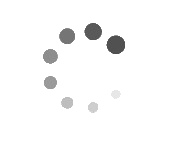경주 분황사 당간지주_8
이미지
- 제공기관
-
- · 촬영연도 : 2022
- · 촬영기관 : 국가유산청
- · 소장기관 : 국가유산청
- 공공누리 유형
-
국가유산청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정보
- 저작물 설명
-
1. 경주 분황사의 연혁과 당간지주 경주 芬皇寺는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사찰로 『三國遺事』의 기록에 의하면 七處伽藍 중의 하나로 634년(선덕여왕 3년) 용궁의 북쪽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당시 분황사는 황룡사와 함께 왕실 차원에서 건립되었으며, 선덕여왕을 비롯한 여러 국왕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신라 선덕여왕은 643년 당나라에서 귀국한 慈藏(590~658년)을 분황사에 머물게 하였으며, 645년에는 자장의 요청으로 皇龍寺塔이 처음 만들기 시작했다. 창건된 이후 황룡사와 함께 중요 사찰로서 중앙 정부나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라 불교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현재 분황사에는 模塼石塔, 각종 石佛, 幢竿支柱, 팔각우물, 碑座 등을 비롯하여 건물에 활용된 많은 석재와 기와편들이 남아있어 고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분황사 입구 남쪽에 세워져 있는 당간지주는 신라시대 분황사 가람의 규모와 배치, 고대 사찰 가람 상에서 당간지주의 배치, 주변 사찰들과의 배치와 방위, 황룡사지는 입구 쪽에 파손되었지만 황룡사의 것으로 보이는 별도의 당간지주가 유존하고 있는 점, 현재의 분황사 가람의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상황이라는 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때 분황사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분황사 소속의 당간지주가 확실시된다고 할 수 있다. 2.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의 양식과 특징 이 당간지주는 일제강점기에 조사 당시 촬영된 여러 사진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두 지주 사이에 세웠던 당간은 남아있지 않지만, 조영 기법과 양식이 동일한 두 지주와 당간을 받쳤던 귀부형 간대석이 원위치로 보이는 곳에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다. 당간지주는 하단부가 깊게 매몰되어 있어 기단부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존하는 간대석과 당간지주 하단부의 치석 수법으로 보아 별도의 가구식 기단을 시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당간지주의 하부를 깊게 매몰하여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당간을 견고하게 받치기 위한 간대석은 다른 당간지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기법의 귀부형 간대석을 마련하였다. 간대석은 신라 시대의 다른 귀부처럼 정연하고 생동감 있는 조각 기법은 아니지만, 간략하게나마 귀두와 발 등을 표현하여 귀부형으로 마련했다. 귀부형 간대석 상면에는 사각형 좌대를 마련하여 앞뒤로 연화문을 장식하였는데, 그 표현 기법이 신라시대의 연화문과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좌대 한가운데에는 작은 사각형을 오목하게 시공하였으며, 한쪽 방향으로는 물이 빠져나가도록 좁게 낙수홈이 시설되어 있어, 상당히 정교한 치석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당간 하부의 평면 형태는 사각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귀부형 간대석에서 귀두의 방향은 당간지주의 방향과 함께 사찰로의 진입 방향을 추정하는데 유용하다. 신라와 고려시대의 당간과 당간지주에서 다양한 유형의 간대석이 마련되는데,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처럼 귀부형 간대석을 구비한 경우는 유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간대석의 조각 기법이 다소 형식화되어 있고, 사실감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용도와 기능을 고려한 조각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치석 수법이나 조각 기법으로 보아 당간지주와 동일한 시기에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당간지주는 동일한 조영 기법과 양식,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다. 당간지주는 귀부형 간대석의 좌우측에 ‘ㄷ’자형으로 홈을 파서, 지주 하단부의 일정 부분이 귀부형 간대석에 삽입 결구되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였다. 당간지주의 전체적인 형태는 평면 사각 석주형인데, 상부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좁아지도록 치석하였다. 당간지주의 바깥면은 지면에서 148cm 정도 되는 높이까지 1단 높게 하였으며, 바깥면의 좌우 측 모서리를 4cm 정도의 너비로 모죽임 하였다. 또한 당간지주의 정상부는 안쪽 면에서 바깥면으로 나가면서 부드럽게 호형을 그리도록 치석하여 다소나마 장식적인 기교를 보이고 있다. 당간은 당간지주의 안쪽면에서 바깥면으로 관통하는 원형 간공(지름 15cm)을 상중하 3곳에 마련하여 간을 끼워 고정하도록 시설하였다. 그리고 안쪽 면 꼭대기에 마련되는 간구는 시공하지 않았다. 이처럼 당간지주의 상중하 3곳에 간공을 마련하여 당간을 고정하는 방법, 당간지주의 바깥면이나 앞뒷면을 1단 높게 하거나 낮게 하는 치석 수법은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에서 많이 적용된 기법이었다.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전체적으로 당간지주의 표면을 고르게 다듬어 마무리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정성스럽게 치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주 지역에 건립된 다른 당간지주와 마찬가지로 정연하면서도 안정된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당간지주의 하부를 1단 높게 치석하고, 외곽 모서리를 모죽임하여 장식적인 기교를 적용한 점이나 관통된 원형의 간공을 마련하여 당간을 고정했던 기법 등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지주부 형태와 외관 등이 경주 망덕사지 당간지주, 경주 보문사지 당간지주, 경주 남간사지 당간지주 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이들 당간지주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3.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의 가치와 의견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통일신라시대의 다른 당간지주들처럼 전체적으로 정연하고 깔끔한 치석 수법과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당간지주의 표면을 고르게 다듬어 마무리하는 등 바깥면을 기교있게 치석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우수한 석공에 의하여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경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요 사찰의 당간지주와 유사한 조영 기법과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관통된 원형의 간공을 상중하 3곳에 마련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귀부형 간대석을 마련하여 당과 당간에 대한 상징이나 의미를 더하였다. 이처럼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전체적인 조영 기법과 양식 등을 통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 등을 검토하고, 기지정된 국가 지정 당간지주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물 설명1. 경주 분황사의 연혁과 당간지주 경주 芬皇寺는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사찰로 『三國遺事』의 기록에 의하면 七處伽藍 중의 하나로 634년(선덕여왕 3년) 용궁의 북쪽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당시 분황사는 황룡사와 함께 왕실 차원에서 건립되었으며, 선덕여왕을 비롯한 여러 국왕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신라 선덕여왕은 643년 당나라에서 귀국한 慈藏(590~658년)을 분황사에 머물게 하였으며, 645년에는 자장의 요청으로 皇龍寺塔이 처음 만들기 시작했다. 창건된 이후 황룡사와 함께 중요 사찰로서 중앙 정부나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라 불교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현재 분황사에는 模塼石塔, 각종 石佛, 幢竿支柱, 팔각우물, 碑座 등을 비롯하여 건물에 활용된 많은 석재와 기와편들이 남아있어 고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분황사 입구 남쪽에 세워져 있는 당간지주는 신라시대 분황사 가람의 규모와 배치, 고대 사찰 가람 상에서 당간지주의 배치, 주변 사찰들과의 배치와 방위, 황룡사지는 입구 쪽에 파손되었지만 황룡사의 것으로 보이는 별도의 당간지주가 유존하고 있는 점, 현재의 분황사 가람의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상황이라는 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때 분황사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분황사 소속의 당간지주가 확실시된다고 할 수 있다. 2.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의 양식과 특징 이 당간지주는 일제강점기에 조사 당시 촬영된 여러 사진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두 지주 사이에 세웠던 당간은 남아있지 않지만, 조영 기법과 양식이 동일한 두 지주와 당간을 받쳤던 귀부형 간대석이 원위치로 보이는 곳에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다. 당간지주는 하단부가 깊게 매몰되어 있어 기단부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존하는 간대석과 당간지주 하단부의 치석 수법으로 보아 별도의 가구식 기단을 시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당간지주의 하부를 깊게 매몰하여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당간을 견고하게 받치기 위한 간대석은 다른 당간지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기법의 귀부형 간대석을 마련하였다. 간대석은 신라 시대의 다른 귀부처럼 정연하고 생동감 있는 조각 기법은 아니지만, 간략하게나마 귀두와 발 등을 표현하여 귀부형으로 마련했다. 귀부형 간대석 상면에는 사각형 좌대를 마련하여 앞뒤로 연화문을 장식하였는데, 그 표현 기법이 신라시대의 연화문과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좌대 한가운데에는 작은 사각형을 오목하게 시공하였으며, 한쪽 방향으로는 물이 빠져나가도록 좁게 낙수홈이 시설되어 있어, 상당히 정교한 치석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당간 하부의 평면 형태는 사각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귀부형 간대석에서 귀두의 방향은 당간지주의 방향과 함께 사찰로의 진입 방향을 추정하는데 유용하다. 신라와 고려시대의 당간과 당간지주에서 다양한 유형의 간대석이 마련되는데,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처럼 귀부형 간대석을 구비한 경우는 유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간대석의 조각 기법이 다소 형식화되어 있고, 사실감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용도와 기능을 고려한 조각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치석 수법이나 조각 기법으로 보아 당간지주와 동일한 시기에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당간지주는 동일한 조영 기법과 양식,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다. 당간지주는 귀부형 간대석의 좌우측에 ‘ㄷ’자형으로 홈을 파서, 지주 하단부의 일정 부분이 귀부형 간대석에 삽입 결구되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였다. 당간지주의 전체적인 형태는 평면 사각 석주형인데, 상부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좁아지도록 치석하였다. 당간지주의 바깥면은 지면에서 148cm 정도 되는 높이까지 1단 높게 하였으며, 바깥면의 좌우 측 모서리를 4cm 정도의 너비로 모죽임 하였다. 또한 당간지주의 정상부는 안쪽 면에서 바깥면으로 나가면서 부드럽게 호형을 그리도록 치석하여 다소나마 장식적인 기교를 보이고 있다. 당간은 당간지주의 안쪽면에서 바깥면으로 관통하는 원형 간공(지름 15cm)을 상중하 3곳에 마련하여 간을 끼워 고정하도록 시설하였다. 그리고 안쪽 면 꼭대기에 마련되는 간구는 시공하지 않았다. 이처럼 당간지주의 상중하 3곳에 간공을 마련하여 당간을 고정하는 방법, 당간지주의 바깥면이나 앞뒷면을 1단 높게 하거나 낮게 하는 치석 수법은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에서 많이 적용된 기법이었다.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전체적으로 당간지주의 표면을 고르게 다듬어 마무리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정성스럽게 치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주 지역에 건립된 다른 당간지주와 마찬가지로 정연하면서도 안정된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당간지주의 하부를 1단 높게 치석하고, 외곽 모서리를 모죽임하여 장식적인 기교를 적용한 점이나 관통된 원형의 간공을 마련하여 당간을 고정했던 기법 등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지주부 형태와 외관 등이 경주 망덕사지 당간지주, 경주 보문사지 당간지주, 경주 남간사지 당간지주 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이들 당간지주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3.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의 가치와 의견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통일신라시대의 다른 당간지주들처럼 전체적으로 정연하고 깔끔한 치석 수법과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당간지주의 표면을 고르게 다듬어 마무리하는 등 바깥면을 기교있게 치석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우수한 석공에 의하여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경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요 사찰의 당간지주와 유사한 조영 기법과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관통된 원형의 간공을 상중하 3곳에 마련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귀부형 간대석을 마련하여 당과 당간에 대한 상징이나 의미를 더하였다. 이처럼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전체적인 조영 기법과 양식 등을 통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 등을 검토하고, 기지정된 국가 지정 당간지주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운로드
-
※ 고화질의 대용량(20~30MB/장)사진의 경우 다운로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예시
- 예시
01 -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 예시
02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 예시
03 -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알아야 할 사항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신청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
고품질 공공저작물 원본 신청
공공누리에서 제공하는 공공저작물 중 공공누리 1유형은 출처표시만 한다면 영리, 비영리 목적으로 모두 활용 가능하며 개작 등 2차 변형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저작물 제공과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원본 이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본 신청 파일 수령 안내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공공저작물 원본 파일을 방문수령 또는 저장장치 배송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본 신청 접수 완료 후 상세 수령 절차는 기입하신 이메일을 통해 안내 드립니다.
* 1일 이내 안내메일 발송(주말제외)
* 원본 저장 장치(USB, 외장하드 등)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하며 왕복 택배비는 신청자 부담입니다.
개인정보이용 동의 안내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공공저작물 원본 관리 및 전달 등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기 업 : 기업명, 소속/부서
- 담 당 자 : 성명, 이메일 주소
- 일반 국민 : 성명,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수집목적
- 이용허가 및 저작권 이용관리
보유기간 : 수집된 정보는 3년간 보존하며, 수집된 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저작권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본신청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
공공누리 이용 약관 및 개인 정보이용 동의